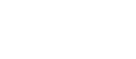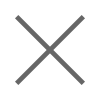마음으로 생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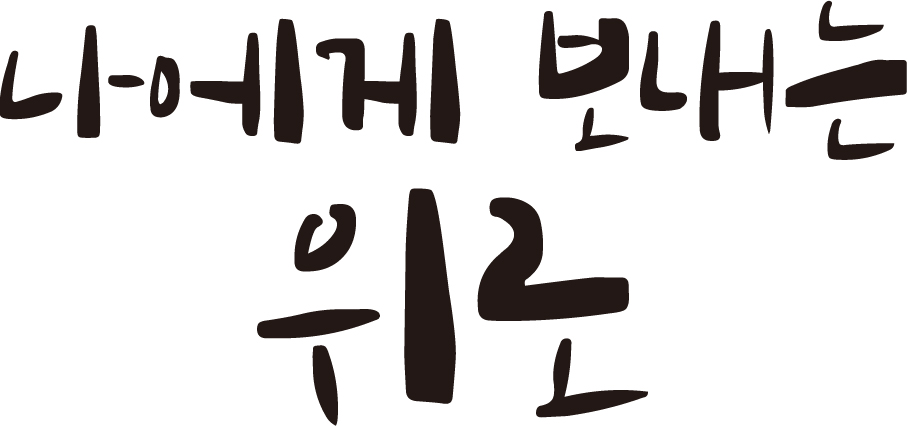
기억이란 뜬금없는 것이다. 이른 추위를 실어온 센 바람이 창을 흔들어 새벽잠이 깼을 때, 문득 대학 시절 첫 과 엠티를 떠올렸다. 여주의 한 고가였다. 가마솥에 불을 때어 갓 지어낸 쌀밥은 소금이라도 넣은 것처럼 간이 맞았다. 저녁 밥상을 물리고 둘러 앉아 자기소개를 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왜 사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단지 내가 아는 건 내 앞의 바로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야. 매순간 나는 거기 내가 깃들도록 노력하며 살고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 의아한 일이다. 갓 스물의 나는 어떻게 그런 삶의 진실을 체감하고 있었을까. 그로부터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난 이제야 그것이 제한된 시간을 사는 우리의 최선이란 걸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 말이다. 영혼이 맑던 시절 얻은 직관의 깨달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은 내 삶의 기조가 되었다. 그리고 세월과 함께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다. 삶이란 기획된 행사처럼 거창한 것이라기보다 스스로 행하는 한 순간 한 순간의 행동들,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것들의 총합이란 사실이다. 숱하게 메워온 순간의 점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큰 궤적을 이룬다. 예상 못한 일에 휘말리는 것도, 별 일 없이 무료하게 지내는 시간들도 모두가 내 시간이요 내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이다. 그 시간이 빠지면 내 삶은 연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로 이전과는 달라진 일상에 곤혹스러웠던 한 해다. 처음엔 기껏해야 몇 달이겠지 싶었다. 그러나 쉽게 끝이 보이지 않았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갈 때쯤, 우리가 겪는 이 어두운 날들도 공중에 뜬 시간이 아니라 엄연한 내 삶의 일부라는 생각을 해냈다. 그러자 바이러스의 세력이 잦아들길 기다리는 일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다. 세상이 어찌 변하든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 되는 것이다. 올 한 해도 내가 겪은 순간의 점들마다 내 온 정신이 있었고, 최선의 몸짓이 담겨있었다. 그만하면 잘 살아냈다.
최경란
에세이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