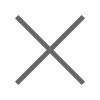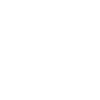

마음으로 생각하기
 URL복사
URL복사
 인쇄하기
인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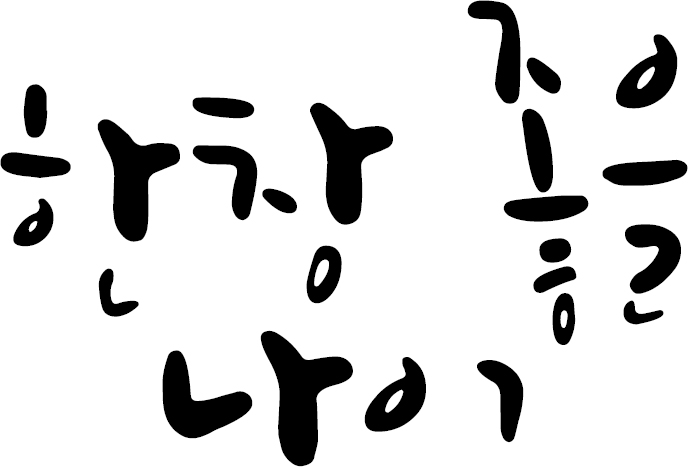
옛날 영화를 봤다. 어린아이들이 공터를 뛰놀고 있었다. 지치지도 않고 달리다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무를 한 바퀴 휘돌았다. 헉헉대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해맑은 웃음이 얼굴 가득 번져 있었다. 한동안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몇몇 장면이 영화 위에 포개졌다. 날씨가 맑아서, 공터가 넓어서, 지치지 않는 두 발이 있어서, 손잡고 놀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저 기쁜 날들이었다. 멋모르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임무와 의무 등 무거운 단어와 멀찍이 떨어져 있던 때였다. 어떤 것을 가리키며 이름을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레고 충만해지던 때였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흡수하고 자기만의 능력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소한 것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등지는 일이기도 하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잠이 부족한 학생에게, 야근하느라 지친 직장인에게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그 당시에는 그 시절이 소중한지 미처 몰랐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촘촘할 때 우리는 굳이 틈을 발견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한지,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틈이 생겼을 때다. 전속력으로 달리다 반환점에서 물을 한 모금 들이켜면 비로소 숨을 고르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웃게 하는 것, 생각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이 떠오른다면 아직 괜찮다. 나를 알아야 나의 행복도 궁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저녁때는 근린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산책을 할 때 나는 나다워진다고 느낀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뚜렷한 목표를 위해 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더없이 생생한 장면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오늘은 일흔이 넘은 할머니가 예순을 막 넘긴 할머니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한창 좋을 나이네.” 산책을 마칠 때까지 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창은 ‘가장 왕성하고 활기가 있는 때’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한, 우리는 모두 한창이다.
오은
작가, <나는 이름이 있었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