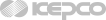스크린이 되다
 URL복사
URL복사 인쇄하기
인쇄하기마을영화사 신지승 감독&이은경 PD 부부


“농촌 마을의 순박한 매력, 그게 시작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5t 트럭. 신지승 감독과 이은경 PD에게 이 트럭은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신 감독이 직접 개조해 만들었다는 이 트럭은 회의실, 분장실, 편집실을 겸하는 이동식 영화 제작소다. 또한 동시에 8살 난 하륵, 하늬 쌍둥이 남매와 반려견 복실이가 함께하는 가족의 보금자리기도 하다. “이 차를 타고 참 많은 여행을 했어요. 지금까지 100여 개가 넘는 마을을 거쳤으니 전국을 다 누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트럭 곳곳을 소개하는 신 감독의 눈빛에 애정이 묻어난다. 그도 그럴 것이 함께한 세월만 자그마치 20여 년이다. 지금은 바람 따라 물 따라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는 두 사람이지만, 신지승 감독과 이은경 PD도 한때는 충무로와 여의도에서 고군분투하던 ‘도시인’ 중 한 사람이었다. 상업주의에 물든 미디어 산업의 팍팍한 현실에 지쳐가던 1999년, 두 사람은 양평으로 귀촌을 선택했다.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정서적인 안정과 여유를 찾고 싶었다. “사실 선택이라기보다는 쫓겨남에 가까웠지만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싶었어요. 도시와 다른 생활방식에 자연스레 이웃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35mm 카메라에 주민들의 모습을 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박한 매력에 빠져버린 거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기존 영화에 회의를 느낀 신 감독은 작품 속에 달콤한 재미, 매끈하고 완벽한 메시지 대신 날 것 그대로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누구누구에게 분한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배어나는 진짜배기 말이다. 농사꾼의 농사짓는 연기를, 장사꾼의 장사하는 연기를 능가할 배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섭외는 생각보다 더 어려웠다. 외딴 마을에는 평생 영화관 문턱을 넘어보지 못한 어르신도 부지기수였다. 숱한 거절에 거절이 이어졌지만 끈질기게 찾아가고 또 부대꼈다. 부부의 진심에 마음을 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둘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부의 영화에 정해진 시나리오는 없다. 신 감독은 발길 닿는 마을의 모든 것이 영화의 소재이며 마을의 모든 이들이 스토리의 원작자이자 주연 배우라 말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곧 영화니까요. 제 역할은 대략적으로 구상해놓은 틀 안에서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에피소드를 커다란 주제 안에 녹여내는 과정에서 다큐멘터리 장르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야기 요소를 가미하죠.”
이 PD는 이런 과정을 별자리에 빗대 설명한다. “빛나는 별 하나하나를 선으로 연결해 형상을 만든 뒤 어울리는 이름과 있음직한 설화를 덧입히는 식이죠. 현장에서 자유로운 애드립이 보장되는 만큼 편집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저는 신 감독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작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포트하고 있어요.” 아내의 든든한 지원사격 멘트에 함께 미소 짓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정겹다.



마을의, 마을에 의한, 마을을 위한 영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육십 몇 번째부터는 헤아리기를 단념한 무수한 작품이 길 위에서 탄생했다. 그리고 부부는 그 간의 작품을 일컬어 ‘돌탑영화’라 명명했다. 때로는 ‘마을영화’, ‘마을공동체영화’, ‘심청이젖동냥영화’라고도 부른다.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두 사람의 영화는 마을과 사람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는 순간, 고요한 마을 곳곳에 생기가 돈다. 신 감독의 촬영 현장에서 방금 전까지 찰진 연기를 선보인 할아버지가 돌연 조명 스태프로 변신한다거나, 길가에서 놀던 아이가 시나리오 회의에 훈수를 두는 것쯤은 그저 예삿일이다. 오직 마을이기에 가능한 일이며 도전이다. “상업영화, 독립영화 할 것 없이 작품 속에 무언가를 담아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형식의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강박을 떨쳐내기로 했어요. 마을 주민 모두가 창작에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예술, ‘공동극창작’이라는 패러다임은 이런 과정에서 도출된 이론입니다.” ‘공동극창작’은 보는 자와 만드는 자의 구분을 없앤 영화 제작 방식이다. 이 PD는 이런 시도가 영화나 문화 생활 등과는 조금 떨어진 지역의 마을 사람들을 문화의 중심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두 눈을 반짝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화만 영화가 아닙니다. 작업을 진행하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듣고 또 어루만지는 동안 화면 밖에서 또 한 편의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반영되는 과정을 ‘축제’처럼 즐기면서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작업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신 감독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의견에 힘을 보탠다. “모든 사물과 생명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죠. 마을에는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묻혀있습니다. 이들을 대신해 개인사는 물론 공동체의 유산을 담은 이야기를 극으로 승화시켜 기록한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작업을 아시아, 아프리카 마을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부부는 DMZ 마을인 서화리 인근에 머물며 주민과 떠돌이 가족이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남북평화선언 이후 달라진 최전방 마을의 분위기를 담아낸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올해 말 개봉을 앞둔 이 영화는 작년 4월, 양평에 마련한 부부의 집이 화재로 전소된 후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서 생활하며 ‘물’과 ‘화장실’을 찾아 여정을 떠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화재 사건 덕분에 새로운 영화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라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는 두 사람. 부부의 행복한 동행이 계속되길 기원하며 민초들이 쌓아 올린 돌탑 같은 이들의 영화가 전 세계 곳곳 퍼져나가길 응원한다.